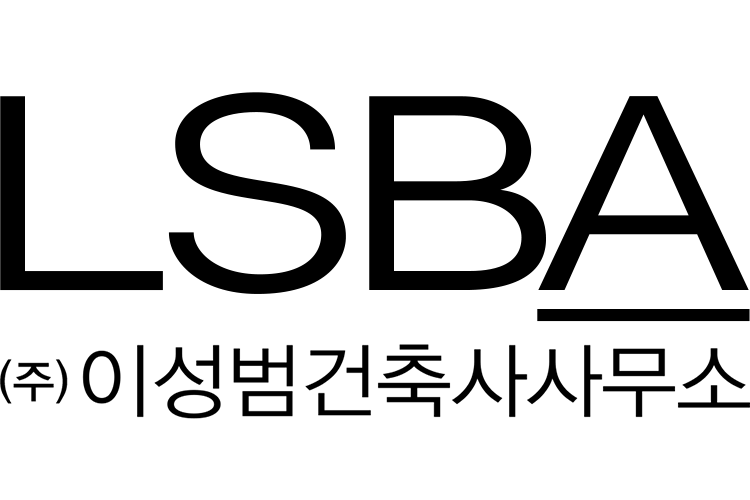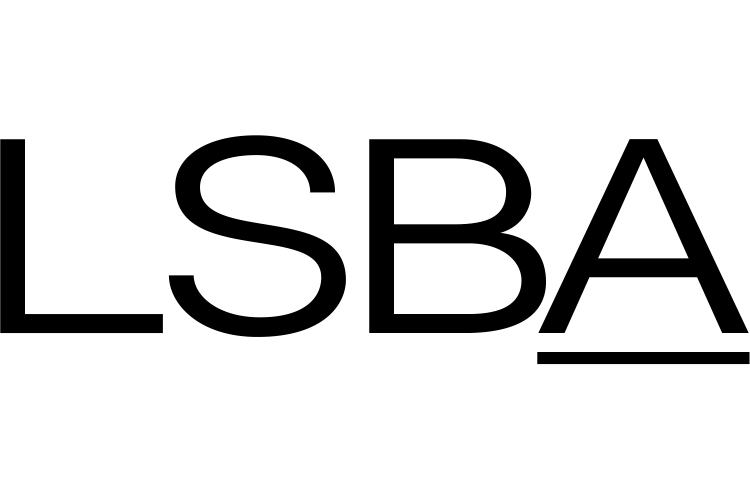서귀포 바다가 굽어 보이는 드넓은 완경사 평지 위에 회색빛 견고한 박공지붕이 평온히 안착해 있다. 대지로부터 살짝 떠 보이는 듯 보이는 지붕과 대지 사이의 틈을호 빛과 공기가 드나들고, 그 안으로 제주의 자연이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육중한 외피는 내부 공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건축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게 했다.
대지 전체를 감싸 안 듯한 제주 돌담은 이 공간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붕 처마 라인과 동일선상에 돌담 상단을 일치시켜 마치 돌담 위에 지붕이 살짝 안착하는 시각적 재미를 준다.
이 스테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조형성, 그리고 그 내부를 짐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캔틸레버구조(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보)로 모든 공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앙에 기능 공간인 주방, 화장실, 계단실을 몰아넣어 기둥 역할을 하게 했다. 건축 공간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식이었다.
단단한 기단 위에 가벼운 듯 지붕을 얹히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를 함께 쓴 하이브리드 공법이 제격이었다. 기단 역할을 하는 중심 코어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위에 얹는 박공지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마감이 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골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럼에도 제주의 거센 바람과 태풍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풍압 설계를 통해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다. 강수에 대비해 얇게 처리된 지붕 끝에 비 처리를 위한 드레인을 매설, 완결성을 갖는 지붕 처마 선을 구현했다.
트믐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었다. 건축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일반적으로 안과 밖으로 나뉘게 되는데, 건축 요소 중 벽, 문, 창, 지붕이라는 요소를 껍질이 아닌 전이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켜’로 인식되게 하고자 했다. 건축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흐름이 존재하는 공간은 공간 사이의 ‘경계’다. 많은 이야기가 함축된 찰나의 공간이기도 하다. 트믐은 바로 이런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어 자연의 흐름 안에 스며드는 건축을 실험하는 공간이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제주의 자연이, 건축공간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시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외부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1층에는 간이 침실 그리고 폴딩도어로 숨겨진 주방과 함께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앉은 사람의 눈높이와 같은 높이로 모든 방향으로 개방되는 띠 창이 펼쳐지는데 창문의 하단 높이까지 조경이 개입된 성토를 하여 외부의 자연적인 요소가 실내 공간으로 관입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중심에 있는 좁은 나선형 게단을 따라 2층 침실에 오르면, 서귀포 앞바다를 향한 극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처마 아래 너른 발코니에는 온수 풀이 매립돼 있어 원경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극적인 공간의 변화는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내 경험자가 공간에 대한 기억을 더욱 또렷하게 뇌리에 남길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비일상의 요소들을 공간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자연과 소재 등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