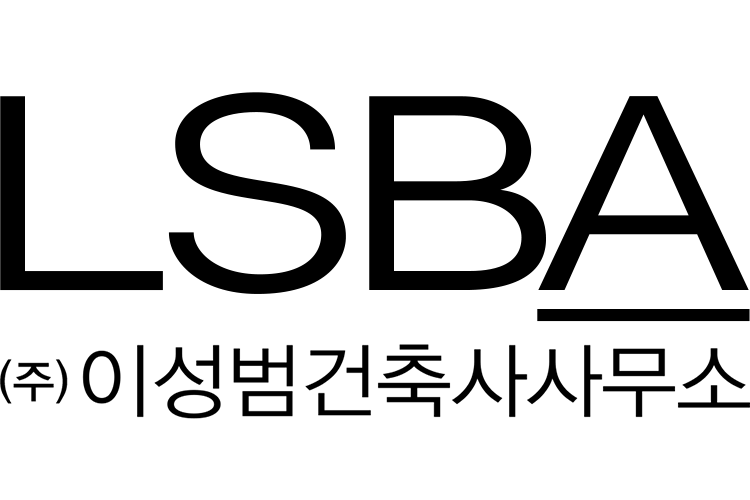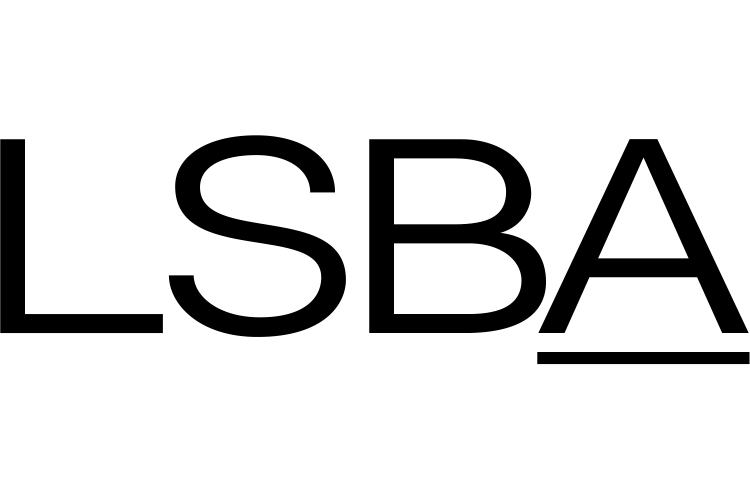부유하는 조율의 공간, 흥해랑
진갈색의 구운 대나무를 입힌 깔롱진 입면이 낙조를 받아 한껏 부드러워진다. 향긋한 미풍이 대지를 감아 돌아가면 둔덕에 살포시 얹혀 부유하는 듯한 갈색 덩어리가 주변과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듯하다. 대지와 덩어리의 사이의 틈으로 자연을 담아내고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곳 흥해의 자연 속 풋풋한 내음을 맡으면 물 흐르듯 자연스레 본연의 자연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구운대나무의 물성
둑방과 면해 있는 낮고 움푹 패인 대지의 특성상 전면의 둑방 도로와 주택의 상호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도로 측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프라이버시확보가 관건이었다. 단순하게 도로와 주택과의 공간을 벽이라는 가림막으로 막는 일차원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구어 그 내식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주된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기를 선별하여 설치한 6cm직경의 구운대나무를 일정간격으로 촘촘히 세워 투영성의 막을 형성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바람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자연적인 소재의 물성을 갖는 입면의 인상은 한가로운 농촌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한다. 특히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갈 구운대나무의 자연스러운 색감의 변화도 차분한 인상으로 푸근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출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된 1층의 벽체와과 대비되는 구운대나무의 물성의 패턴은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입면에 변화를 준다.
둑방길 아래 오목한 대지
곡강문화탐방길을 끼고 안퐁한 대지에 자리 잡은 이 곳은 시골의 여느 마을처럼 논과 밭의 풍경을 배경으로 무척 호젓한 곳이다. 하지만 경관이 뛰어난 곳은 아니어서 주변의 동네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연적인 물성과 하늘 그리고 야산의 소나무 군락을 이용하여 자연과 건축물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만 했다. 1층은 프라이빗한 침실과 주출입구와 연계된 외부조경공간이 자리 잡는다. 2층은 작은 자쿠지를 갖는 외부데크 공간과 주생활공간이 스튜디오 타입의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2층은 대나무벽체를 사이에 두고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시선을 산란시켜 건축물의 조형성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내외부 공간의 전이
현관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전창을 통해 낮게 깔린 외부 정원이 한눈에 펼쳐진다. 좁은 공간을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을 해소하면서도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공간적 확장을 의도하였다. 1층과 2층은 황토색의 철재계단으로 그 높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 계단실의 둥근 천창을 통해 계단실로 쏟지는 태양의 궤적에 의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2층에는 하늘과 바닥으로 시선이 확장이 가능한 오픈부위가 있는데, 1층에 식재된 조경요소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가 2층의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조경요소가 된다. 2층에 다다르면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자쿠지와 주방과 식당, 거실로 연결되는 일체화된 공간이 있다. 하늘로 열려 있는 외부 데크에서는 뒷산의 소나무군락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로 재단된 하늘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벽체의 틈을 통해 은은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멋진 석양을 즐길 수 있는 대나부 폴딩도어도 그 나름의 운치로 공간과의 관계를 재조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