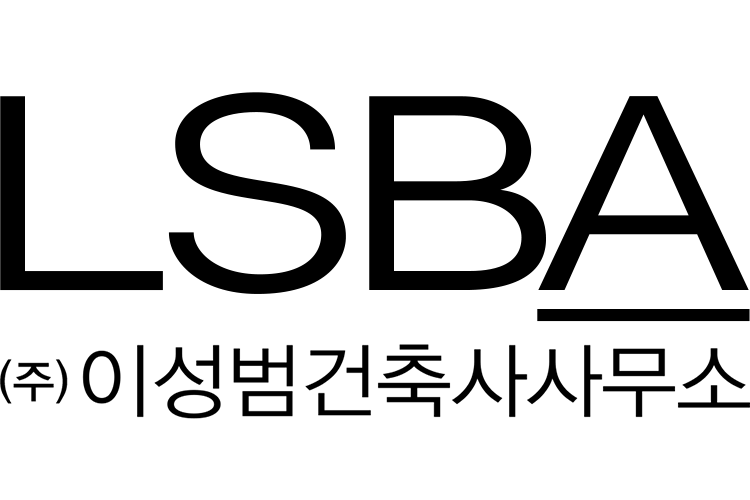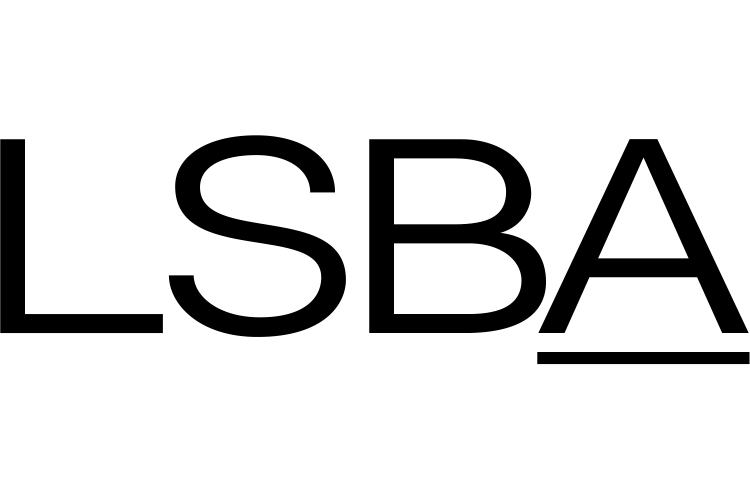대지는 제주의 아름다운 비자림 아래 해안까지 연결되는 드넓고 평평한 대지(제주말:벵듸)가 있는 곳으로 평대리라 부르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월정리 해변의 현란하고 번잡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직은 개발이 덜 되어 옛 모습과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더욱 한적하고 여느 시골과 다름없는 조그만 마을의 분위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대지앞쪽을 가로 질러가는 불림모살길(제주올레길20코스)을 걷노라면 서로 엇갈려 마주하는 세 개의 삼각형의 독특한 조형을 가진 건축물을 마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집에 기거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같은 필지 안에 독채민박을 운영하면서 직접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했고 각각의 공간은 투숙객의 프라이버시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명확히 분절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형의 대지에 안착되어 분절되는 건축공간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여러 생각지 못한 각기 다른 성격의 마당을 만들어내고 그 마당들이 서로 얽히면서 마치 제주전통가옥을 진입하기 위한 올레 길의 전이 공간적 성격을 어렴풋이 담아낼 수 있었다.
올레길목 각기 다른 세 개의 삼각형
한적한 시골마을의 어귀에 위치한 이곳은 제주이지만 제주스럽지 않은 여느 농촌의 모습과도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곳이다. 해변에 가까이에 위치 하지만 평평한 대지의 형태 때문에 시각적 확장을 고려한 바다조망이 쉽지 않고 지역적 마을의 조직자체가 워낙 밀도가 높지 않고 나지막한 집들의 군집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러한 곳에 무언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았다. 거대한 볼륨을 가지는 건축물 보다는 오히려 분절되고 지형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앉혀지길 원했고, 올레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의 위치변화에 따라 보이는 건축물의 시각적인 입면변화와 거대한 입면의 모습이 아닌 분절된 건축물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길 원했다. 평지의 지형이 융기되어 자연스레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대지 내에서 시각적인 확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구상했고, 입면의 소재도 외벽과 지붕을 같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려하였다.
지붕 위 계단, 생각지 못한 시각적 전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안에서 계단은 높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인 도구 혹은 만남, 대화, 휴식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계단은 통행의 장소이기도 하고 공간을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연결하기도 한다. 이 곳에서의 계단은 특히 역동적이면서도 반면에 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단순히 높이를 극복하는 계단의 성격보다는 ‘풍경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단위에 올라서면 3개 층 높이정도까지 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올라서면 1층 레벨에서 생각지 못한 시각적 개방감과 그곳에 오르기까지 올레 길의 연속성상에서 골목길을 따라 오르는 시각적 전이를 통한 즐거움으로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에서 계단은 이 집과 자연과 하나가 된다.
삼각형공간안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공간구조
실내 공간은 삼각형의 형태에 맞게 다양한 레벨값들을 가지며 각각의 공간들로 구성이 된다. 스테이로 사용되는 적 벽돌로 마감되는 두개의 동은 15평의 면적으로 2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작은 평수 안에서도 정면 쪽으로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침실과 욕실을 두어 1층의 거실공간과 각기 다른 두개의 연결동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동의 경우 1층은 외부 마당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실을 비롯, 주방공간과 펜트리로 구성되고 2층은 가족이 함께 취미생활을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두 딸아이를 위한 방으로 구성이 된다. 이 모든 공간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층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층위에 따른 영역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